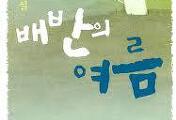<별을 보여드립니다, 1969>
“꿈은 이루어진다!”는 흔한 표어에서 "꿈"이라는 단어는 종종 별 모양으로 대체될 정도로, 꿈과 별은 동일시되는 단어다. 별은 이곳이 아닌 저곳,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꿈 역시 그러하다. 현실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것.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그렇다면, 꿈을 꾸면 우리는 행복할까. 희망을 품으면 과연 즐거울까? 아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괴롭다. 척박한 현실을 끊임없이 곱씹어야 하고,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비난해야 한다.
소설 속의 "그" 역시 그러하다. 천체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말 그대로 별을 보는 사람이다. 동시에 그는 꿈을 바라본다. 현실이 아닌 꿈과 희망을 바라본다. 하지만, 별을 보면 볼 수록, 구질구질한 현실이 오히려 돋보일 뿐이다. 그는 힘겨운 현실을 뚫고 뚫어 거기까지 갔지만, 이제는 너무도 지친 듯하다. 시골에 계신 홀 어머니의 죽음을 홀가분해할 정도로 그는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별과 땅 사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부유해야 하는 걸까.. 언제까지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고 허공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 걸까..
별을 보는 것이, 꿈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래서 차라리 꿈을 버리는 것이 그의 고통을 경감 시키는 것이라면... 그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천체 망원경을 한강에 가라앉힌다. 망원경의 장례... 아니 꿈의 장례식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숨통이 트인다면, 꿈을 버리는 것 역시 삶을 견디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모두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라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불굴의 의지로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별을 기르는 아이, 1976>
서울로 돈 벌러 간 누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용이의 꿈이다. 누나를 찾기 위해 그는 서울의 인력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중국집 배달원 날품팔이 생활을 이어나간다. 얼핏 봐도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런 삶을 그는 별 괴로움 없이 자~알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누나를 찾는 꿈, 누나를 다시 만난다는 그 꿈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은 어딘가 모르게 유쾌하다. 능청스럽고 뻔뻔하며 터무니없이 당당하다. 삶에 찌들지도 않고, 삶에 주눅 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진용이는 이미 알고 있다. 그의 누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용이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 누나를 만난다는 자신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그 희망찬 꿈으로 인해 삶이 생동할 수만 있다면, 그가 두 발을 땅에 디디고 달릴 수만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허황된 꿈이 그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라면, 설령 이루어지지 않을 꿈일지언정, 간직하는 것이 그가 삶을 견뎌내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것으로 그가 척박한 현실을 쉬이 쉬이 건너갈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이 허망일지라도 상관없는 일 아니겠는가…
추가////
이 단편 집의 첫 번째 단편은 <별을 보여드립니다>이고, 마지막 단편은 <별을 기르는 아이>이다. 이 두 단편의 화자는 모두 “나"인데, 각 단편의 주인공인 “그"와 “진용"이를 관찰하는 입장이다. 이 두 주인공은 모두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명은 꿈을 한강에 가라앉히고, 한 명은 꿈을 기르면서 살기로 한다. 누구의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 꿈이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면, 꿈을 물 아래로 가라앉히는 것도 괜찮고, 꿈을 품고 길러야, 당신의 현실을 견딜 수 있다면, 그 꿈을 간직하는 것도 괜찮다고.. 꿈을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버리는 것도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한국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청준 단편 소설 <행복원의 예수, 1967> (0) | 2018.09.03 |
|---|---|
| 박완서 단편집 2권 <겨울 나들이 외,1975~1978> (0) | 2018.08.09 |
| 박완서 단편 <배반의 여름,1976> (0) | 2018.08.08 |
| 박완서 단편 소설 <저렇게나 많이!,1975> (0) | 2018.08.07 |
| 편혜영 단편 <소풍> <사육장 쪽으로> (0) | 2017.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