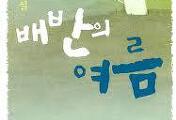내가 앓고 있는 병은 무엇인가. 나를 병실에 가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병은 자아 상실이고, 나를 병실에 가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창문을 향한 기이한 상념.. 막연한 상념... 무엇을 생각하는가. 스스로는 기이하고 막연한 상념이라 하였으나, 아니다. 나는 창문 밖의 구체적인 세상을 생각한다. 탈출을 소망한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계탑은 고장 나 있어, 시계침마저 떼어져 버려 있다. 저 고장 난 시계탑처럼 나의 시간은 멈춰있다. 병실이 아닌 자기 안에, 위궤양이 아닌 자아망실이라는 병을 가지고 "그렇게 시체처럼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다."
윤 간호사는 나의 분신이다. 내 안의 목소리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멈춰진 시간 속에 널부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는 자신 안의 목소리다. 그녀는 나에게 거울을 건네준다. 나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 나에게는 "이야기" 가 있다는 것이다. 너무 깊이 숨어버린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것을 윤 간호사는 독려한다.
같은 병실을 쓰던 한 남자. 이 남자는 침묵 속에 벽을 향해 찰싹 붙어있기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남자는 죽었다. 저 남자처럼 될 수는 없다. 멈춰진 시간 속에, 이 병실 속에, 자기 망각 속에, 침묵 속에 나를 유폐시켜 둘 수 없다. 세상과 등진 채 그렇게 시체처럼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이야기가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설령 자기 대화에 불과할지라도, 내 안에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여 나는 윤 간호사의 말대로 내 마음에 시계 침을 꽂아보려 한다. 나에게 그럴 힘이 있다고 그녀가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분명 시간 속으로, 창문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 퇴원에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의 허락도, 간호사의 허락도 필요치 않다. 이제 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한 거리로 나는 천천히 병원 문을 걸어나갔다."
추가 : 등단작은 '나는 왜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출사표다. 이야기하는 것이 설령 자기 웅얼거림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병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병원을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글을 써야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한국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완서 단편 소설 <저렇게나 많이!,1975> (0) | 2018.08.07 |
|---|---|
| 편혜영 단편 <소풍> <사육장 쪽으로> (0) | 2017.08.18 |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995> (0) | 2017.02.27 |
| 박완서 <나목, 1970> (0) | 2017.02.23 |
| 박완서 단편집 1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971~1975> (0) | 2017.02.14 |